가계부실위험지수(HD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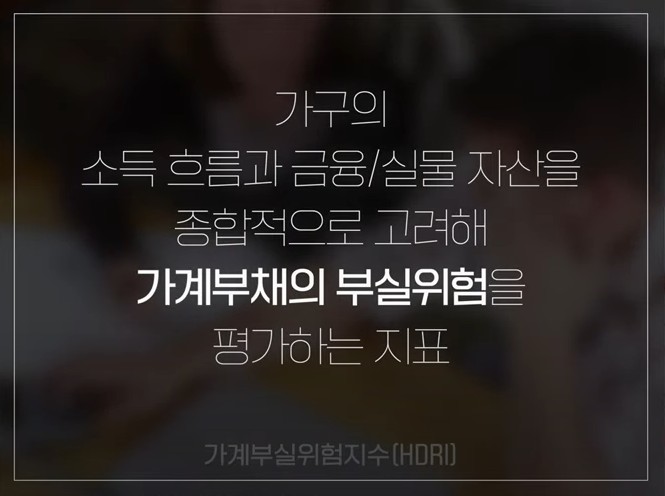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음.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대출할 때 한 번씩 들어보았을 단어이다.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지표로, 부동산 관련 용어에서 자주 등장한다.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부채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DSR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DSR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따라서 소득이 높거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낮다면 DSR이 낮다.
반대로 소득이 낮은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면 DSR이 높아 위험하다 볼 수 있다.
현재 규제는 1억 원 초과 대출자의 경우 40%(2금융권 50%)이며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연간 대출상환을 4000만원씩 하고 있다면 DSR 40%에 해당한다.
월에 200을 받는데 대출로 80만원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면 어떨까?
돈을 벌긴 벌지만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부채/자산 비율(DTA)란?
Debt To Asset Ratio
가구가 보유한 모든 대출금/가구의 자산
예를 들어 자산이 1억인데 대출금이 1억이라면 자산을 다 처분하였을 때 남는 것이 없다.
간단하게 DTA가 높으면 좋지 않다.

현재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충분한 듯 하여 대출 시 영끌을 하기도 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하는 것을 본다.
물론 자산가격이 상승해서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익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대출은 무서운 것이다.
카드할부처럼 매월 소비하지는 않지만 내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대출상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사람이 살다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특히나 질병이나 사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질소득이 적다면 저축의 여력도 없을테고 대출에 카드명세서에 허덕이다가 좋지않은 결말을 보기도 한다.
나라님이 권장하는 기준치를 충분히 잘 지켜서 편안한 일상을 즐기시길 바란다.